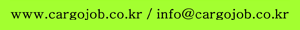고려종합국제운송 권오인 대표
최근 “바다, 저자와의 대화” 제180강에서 최덕림 상무(삼성SDS 네델란드)와 이상근 대표(삼영물류)가 “유럽에서 바라본 세계 컨테이너 해운 시황”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물류”의 주제 발표를 하였다. 발표를 마치고 질의응답 시간에 물류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관계자들의 답변을 종합하고 입체화하여 공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았다.
한국은 일반인들이 평소에 사용하는 택배와 직구 그리고 상품과 원자재를 수출 또는 수입하는 무역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물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류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미흡하여 실무 현장에서는 사용자에 따라서 구구각각 사용되고 있다. 최근 논의가 활발한 “한국국제물류협회(KIFFA)”의 물류의 산업화 주장을 감안하여 관련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물류 전반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1. 물류(物流, Physical distribution, Logistics)의 사전적 의미와 관련 협회/학회의 정의
물류(物流, Physical distribution)는 재화(財貨)를 공급자로부터 수요자에게 이동시킴으로써 시간적, 장소적 효용을 창출하는 물리적인 경제활동을 물류라고 한다.
한국해사문제연구소가 발간한 해운.물류 큰사전에 따르면 물류란 물적(物的) 유통을 말하는데,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공급자로부터 소비자 또는 사용자까지 원자재, 중간재, 완성재 그리고 관련 정보를 이동시키는 것과 관련된 흐름과 저장을 효율적이면서 효과적으로 계획, 집행, 통제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 물류활동은 일반적으로 운송, 보관, 포장, 하역, 정보의 활동으로 구성된다.
물류라는 용어는 1964년 일본 국토교통성 주관으로 “綜合物流施策大綱”등 정부 차원에서 물류 정책 논의가 시작되면서 “물류”라는 용어가 공식화되었다.
동경대 이노우에 다케시(井上 猛) 물류 경제학 교수는 그의 연구 논문에서 Logistics Management를 물류관리(物流管理)로 번역하여 물류라는 용어가 정착되기 시작하였다. 물류는 상적유통(商的流通)과 비교하면 상적유통이 상품의 소유권 이전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것에 비해 물적유통(物的流通)은 상품의 물리적 이동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것을 말한다.
미국은 물류 관련 협회가 경제의 발전에 따라 물류의 정의를 확장시켜 왔다.
1963년 NCPDM(National Council of Physical Distribution Management)은 물류를 물리적 유통(Physical Distribution)에 초점을 두고 운송, 보관 중심의 전통적 물류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Physical distribution is the process of planning, implementing and controlling the movement of goods from point of production to point of consumption.”
1985년 CLM(Council of Logistics Management)은 물류를 공급망 내에서 계획, 실행, 통제하는 활동으로 정의를 확대하였다. “Logistics is the process of planning, implementing and controlling the efficient, effective flow and storage of goods, services, and related information from point of origin to point of consumption in order to meet customer requirements.”
2005년 CSCMP(Council of Supply Chain Management Professionals)는 물류를 기존 정의에 추가하여 디지털화, 글로벌화, 지속가능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물류는 공급망관리(SCM)의 하위개념으로 물류를 정의하였다. “Logistics is that part of supply chain management that plans, implements, and controls the efficient, effective forward and reverse flow and storage of goods, services and related information between the point of origin and the point of consumption in order to meet customers’ requirement.”
한국은 1969년 “대한항공화물주선업협회”가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이듬해 1970년 교통부의 설립인가를 받았고, 1983년 “한국항공화물협회”로 개칭하였다. 한편 1977년 “한국해상운송주선협회”가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같은 해 해운항만청의 “한국해상주선업협회”로 인가받았고 1986년 “한국국제복합운송업협회”로 개칭하였다.
1996년 교통부로부터 “한국복합운송주선업협회”로 양 협회가 합병하여 인가를 받았다. 2008년 물류정책기본법 시행에 맞추어 “한국국제물류주선업협회(Korea Freight Forwarders Association: KIFFA)”로 개칭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82년 “한국해운학회”가 설립되었고 2003년 “한국해운물류학회”로 변경하였다. 1991년 “한국물류학회”가 창립되었고, 2001년 “한국SCM학회”가 창립되어 공급망 관리 분야의 연구와 국제 교류에 기여하고 있다. 대략 정의는 미국의 Logistics 협회의 것을 사용하고 있으며 용어는 물류(物流)라고 하여 일본의 용어를 따르고 있다.

2. 복합운송주선인(Freight Forwarder)와 NVOCC(Non-Vessel Operating Common Carrier)
1) 복합운송주선인(複合運送周旋人, Freight Forwarder)
상법 제114조는 “자기의 명의로 물건운송의 주선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운송주선인이라고 한다”라고 규정한다. 즉 ‘운송을 영업으로 하는 자’가 아니라 ‘운송의 주선을 영업으로 하는 자’이다.
그런데 과거의 해운법 상의 규정이나 화물유통촉진법은 제2조 제6호에서 “복합운송주선업이라 함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의 선박, 항공기, 철도 차량 또는 자동차 등 2가지 이상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의 운송을 주선하는 사업을 말한다”라고 상법상의 규정과 비슷한 취지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그 등록요건을 규정한 동 시행령 제11조 제3호는 “주거래 운송사업자 또는 주거래 복합운송사업자의 명칭 및 영업소재지를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이 시행령 상의 문언(문언)은 국제복합운송주선인인 동시에 국제복합운송주선인의 대리인으로 해석되는 모순을 안고 있다.
2) 무선박공중운송인(無船舶公衆運送人, NVOCC Non-Vessel Operating Common Carrier)
미국 해운법상의 공중운송인으로 스스로 운송수단을 지니지 않은 채, 화주에 대해서 자기의 요율(Tariff, 料率)에 의하여 운송을 인수하여, 선박회사를 하도급인(下都給人)으로 하여 이용운송(利用運送)을 하는 해상운송인을 말한다.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선박 비운항 공중운송인’이라 하겠다.
이석행 시마스타 대표에 따르면 한국은 NVOCC와 Freight Forwarder를 구분하지 않고 포워더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NVOCC와 Freight Forwarder의 구분은 B/L(船荷證券, Bill of Lading) 발행 여부에 따른다. B/L을 발행하면(NVOCC가 발행하는 B/L을 House B/L이라고 함) 그들은 NVOCC로서 운송인(Carrier)이 된다.
미국의 연방법 CFR46 (Shipping)의 정의에 따르면 NVOCC는 선박을 갖고 있지 않지만 ‘선하증권(B/L)을 발행하는 자’로 정의되어 있고 반면에 Freight Forwarder는 ‘화주를 위해서 운송 주선을 해주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를 Shipper로부터 받는 자’로 정의된다.
Actual Shippers(실 송화주)와 NVOCC간에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후 NVOCC는 다시 선박을 가진 Ocean Carrier와 화물운송을 체결한다. 따라서 Ocean Carrier의 B/L상의 Shippers(송하인)은 선적지의 NVOCC가 되고 Consignees는 양하지의 선적지 NVOCC Partners가 된다.
즉, NVOCC가 개입되는 컨테이너화물의 경우 Actual Shipper<-->NVOCC<-->Ocean Carrier간 2개의 상이한 운송계약이 존재하고 NVOCC의 개입 없이 직접 화주가 Ocean Carrier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해당 화주가 Ocean Carrier가 발행하는 B/L상 Shippers가 된다.
김인현 교수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대한 구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상법은 운송인이라고만 하여 두 사람이 모두 운송인이다. 미국은 그를 NVOCC(Non-Vessel Operating Common Carrier)라고 부른다. 선박을 가지지 않고 개품운송을 하는 운송인이라는 취지이다.
일본의 경우에 그를 貨物利用運送事業者라고 부른다. 운송사업자가 있는데 운송사업자를 이용한다는 취지에서 붙인 이름이다. 운송주선업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그러나 위탁자의 계산으로 일을 하는 자이다. 그가 직접 운송인이 되면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계산으로 계약이 체결된다.
위 일본법은 貨物利用運送事業者를 운송인으로 정의하고 있다(貨物利用運送事業法 제2조). 해상운송의 공공성 때문에 어느 정도 규모는 있어야 하므로 국가에 등록하게 한다(제3조). 화주를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경쟁법적인 규정도 들어있다(제10조). 약관을 사용하여 화주와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정부의 사전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제8조).
우리나라에는 운송주선인이 운송인이 직접 되는 경우를 입법화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운송인이 되는 운송주선인의 지위가 불안하다. 물류정책기본법에서 정하는 국제물류주선인은 “자기의 이름으로 자기의 계산으로” 주선 업무를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제2조 11호). 이는 상호 모순이다. 자기의 이름으로 자기의 계산으로 업무를 하면 운송인이 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러나, 다시 주선을 한다고 해서 혼란을 야기한다. 일본의 화물이용운송사업법의 취지를 담은 법 제도를 우리도 도입해야 한다.
다음호에 이어
[ⓒ 코리아포워더타임즈 & parcelherald.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기
PEOPLE - 최신 주요기사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